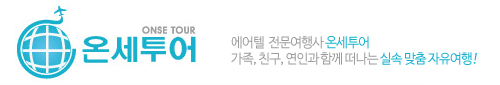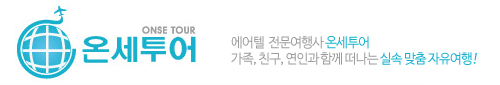|
вҖӢнҷ©лҸҷмқёй»ғйҠ…еҚ°
 
мӢңм„ и©©д»ҷ мқҙнғңл°ұ(жқҺзҷҪ)мқҳ и©© мһҘ진주е°ҮйҖІй…’м—җ мқҙлҹ° кө¬м Ҳмқҙ мһҲлӢӨ "к·ёлҢҖлҠ” ліҙм§Җ лӘ»н–ҲлҠ”к°Җ? к·Җн•ң 집 мӮ¬лһҢмқҙ кұ°мҡёмқ„ ліҙл©° л°ұл°ңмқ„ м„ңлҹ¬мӣҢн•ҳлҠ” кІғмқ„, м•„м№Ём—җлҠ” н‘ёлҘё мӢӨкіј к°ҷлҚ”лӢҲ м Җл…Ғм—” лҲҲмІҳлҹј нқ¬м–ҙмЎҢл„Ө." нҷ©лҸҷ нҳ№мқҖ мІӯлҸҷкұ°мҡёмқҖ мң лҰ¬кұ°мҡёмқҙ л°ңлӘ…лҗҳкё° мҲҳмІңл…„ м „л¶Җн„° м§ҖмІҙлҶ’мқҖ к°Җл¬ёмқҳ к·ңмҲҳк°Җ м–јкөҙмқ„ 비춰ліҙл©° м№ҳмһҘмқ„ н•ҳкё°лҸ„ н•ҳкі м ҠмқҢмқҙ к°ҖлҠ” кІғмқ„ н•ңнғ„н•ҳкё°лҸ„ н•ҳмҳҖлҚҳ м •к°җ к°ҖлҠ” кё°л¬јмқҙлӢӨ. вҖӢ ліҖмғүлҗң мІӯлҸҷкұ°мҡёмқҖ мӢңмқёмқҳ л¶ҖлҒ„лҹ¬мҡҙ кіјкұ°лҘј л°ҳ추н•ҳкё°лҸ„ н•ҳм§Җл§Ң, мһҳ лӢҰмқё нҷ©лҸҷкұ°мҡёмқҖ л°қмқҖ лҜёлһҳлҘј ліҙм—¬мЈјлҠ” мҳҲм–ёк°Җмқҳ м—ӯн• мқ„ н•ҳкё°лҸ„ н•ңлӢӨ. мІҳмқҢ лҢҖн•ҳлҠ” мҙүк°җмқҖ м°Ёк°‘м§Җл§Ң мІҙмҳЁкіј н•Ёк»ҳн•ҳл©ҙ мқҙлӮҙ л”°мҠӨн•ң мЈјмқёмқҳ мҳЁкё°лҘј н’Ҳм–ҙ м•ҲлҠ”лӢӨ. мқҖк·јнһҲ лӢ¬кө¬м–ҙ진 лҶӢмҮ нҷ”лЎңмІҳлҹј. вҖӢ м§ҖлӢҲкі мһҲмңјл©ҙ, мЈјмқём—җкІҢ көім„ёкі к°•кұҙн•ҳкІҢ мқёмғқмқ„ мӮҙм•„к°Җлқј мұ„м°Қм§Ҳн•ҳкі , нһҳл“Өкі м–ҙл Өмҡёл•Ң н•Ёк»ҳн• лІ—мқҙ лҗҳм–ҙмӨ„ кІғмқҙлӢӨ. нҢҪк°ңм№ҳкі м§–л°ҹм•„лҸ„ к№Ём§Җкұ°лӮҳ л¶Җлҹ¬м§Җм§Җ м•Ҡкі мЈјмқёмқҳ м—ӯмӮ¬ліҙлӢӨ мҳӨлһҳлҸ„лЎқ мӮҙм•„ лӮЁмңјлҰ¬лқј. лҲ„к°Җ м•ҢкІ лҠ”к°Җ, кёҙ м„ёмӣ” м§ҖлӮҳ мһҘлЎұмҶҚ к№ҠмқҖ кіім—җ н‘ёлҘё л…№ лҒјм–ҙ мһ л“Өм–ҙ мһҲмқ„ л•Ң мІң진н•ң м•„мқҙк°Җ к·ёкІғмқ„ м°ҫм•„ к№ЁмӣҢ нӣ„нӣ„ мһ…к№Җ л¶Ҳл©° к°Ҳкі лӢҰм•„, к·ёлҢҖ мқҙлҰ„ л°•нһҢ нҷ©лҸҷлҸ„мһҘмқ„ м„ёмғҒм—җ лӮҙм–ҙлҶ“мқ„м§Җ. вҖӢ
м ңмһ‘кіјм •мқҖ м•„лһҳмҷҖ к°ҷлӢӨ. 
мў…мқҙм—җ мқёкі н•ҳкё°. .

й»ғйҠ… еҚ°йқўм—җ мқёкі н•ҳкё°. . 
к°•мҮ нҸүм •мңјлЎң мӘјм•„ кёҖм”Ё мғҲкё°кё°. . 
мҷ„м„ұ. вҖӢ. . м№јмқҙлӮҳ м°Ҫкіј к°ҷмқҖ л¬ҙкё°лЎң мӮ¬мҡ©н• л§ҢнҒј лӢЁлӢЁн•ң нҷ©лҸҷм—җ кёҖм”ЁлҘј м–‘к°ҒмңјлЎң мғҲкё°лҠ” мқјмқҖ кІ°мҪ” л…№л…№м№ҳ м•ҠлӢӨ. мқҙкІғмқҖ кі н–үм—җ к°Җк№Ңмҡҙ мһ‘м—…мқҙлӢӨ. мІЁлӢЁ м»ҙн“Ён„° мЎ°к°Ғкё°кі„л“Өмқҙ л„җл ӨмһҲлҠ”лҚ° көімқҙ мҲҳмһ‘м—…мқ„ кі м§‘н•ҳлҠ” кІғмқҖ лҸ„мһҘмқҙ мқҳлҜён•ҳлҠ” мғҒ징м„ұ л•Ңл¬ёмқҙлӢӨ. мқёмһҘмқҖ к·ё мӮ¬лһҢмқҳ мқён’Ҳмқ„ л“ңлҹ¬лӮҙкі , к·ёмқҳ мқём„ұмқҙ мқҙлҰ„кіј н•Ёк»ҳ лҸ„мһҘмңјлЎң мІҙнҷ”лҗҳм–ҙ лӘёмІҙм—җ мғҲ겨진 кІғмқҙлӢӨ. мқҙлҹ¬н•ң лҜҝмқҢмқҳ мӢ н‘ңдҝЎжЁҷлҘј м–ҙм°Ң к°җм • м—ҶлҠ” м°Ёк°Җмҡҙ кё°кі„лҚ©мқҙм—җ л§ЎкёёмҲҳ мһҲкІ лҠ”к°Җ. кіҒлҲҲмңјлЎңлҸ„ нҳёкё°мӢ¬ н•ҳлӮҳ мЈјм§Җ м•ҠлҠ” мқёмһҘмқёеҚ°з« дәә л§Ҳм§Җл§ү м„ёлҢҖмқҳ мһ‘н’Ҳмқҙ л¬ҙлӘ…мқҳ мң л¬јлЎңлқјлҸ„ лӮЁкІЁм§Җкё°лҘј л°”лһ„ лҝҗмқҙлӢӨ. . . .
|